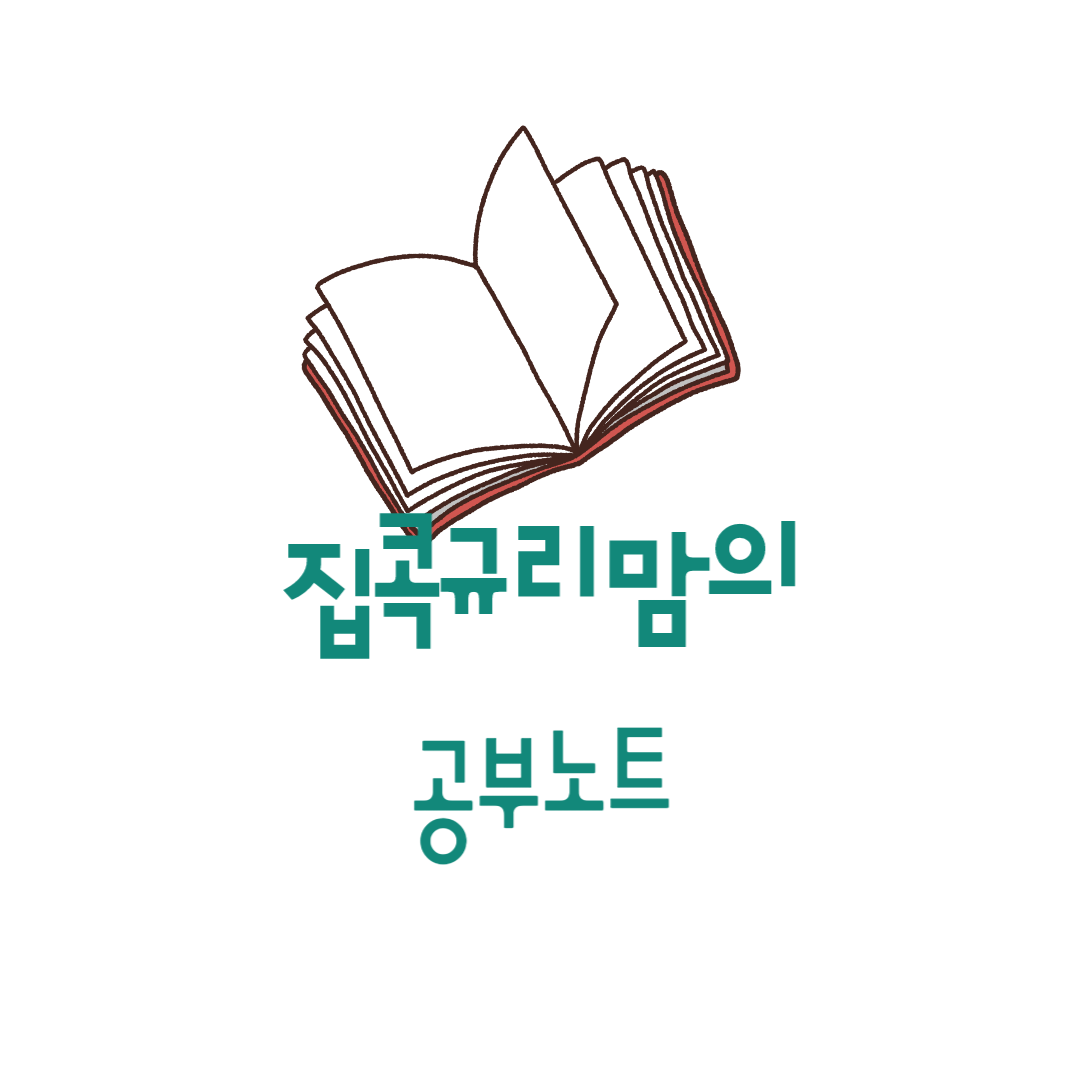[요약]
통계청이 발표한 ‘2017~2022 소득이동통계’에 따르면, 한국의 소득계층 이동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. 소득분위 이동률은 34.9%로, 상향이동은 17.6%, 하향이동은 17.4%입니다. 특히 청년층이 노년층보다 소득 이동성이 높았으며, 하위 1분위 탈출률은 68.7%로 확인되었습니다. 이는 청년층의 경제적 역동성은 높지만, 전체적인 계층 고착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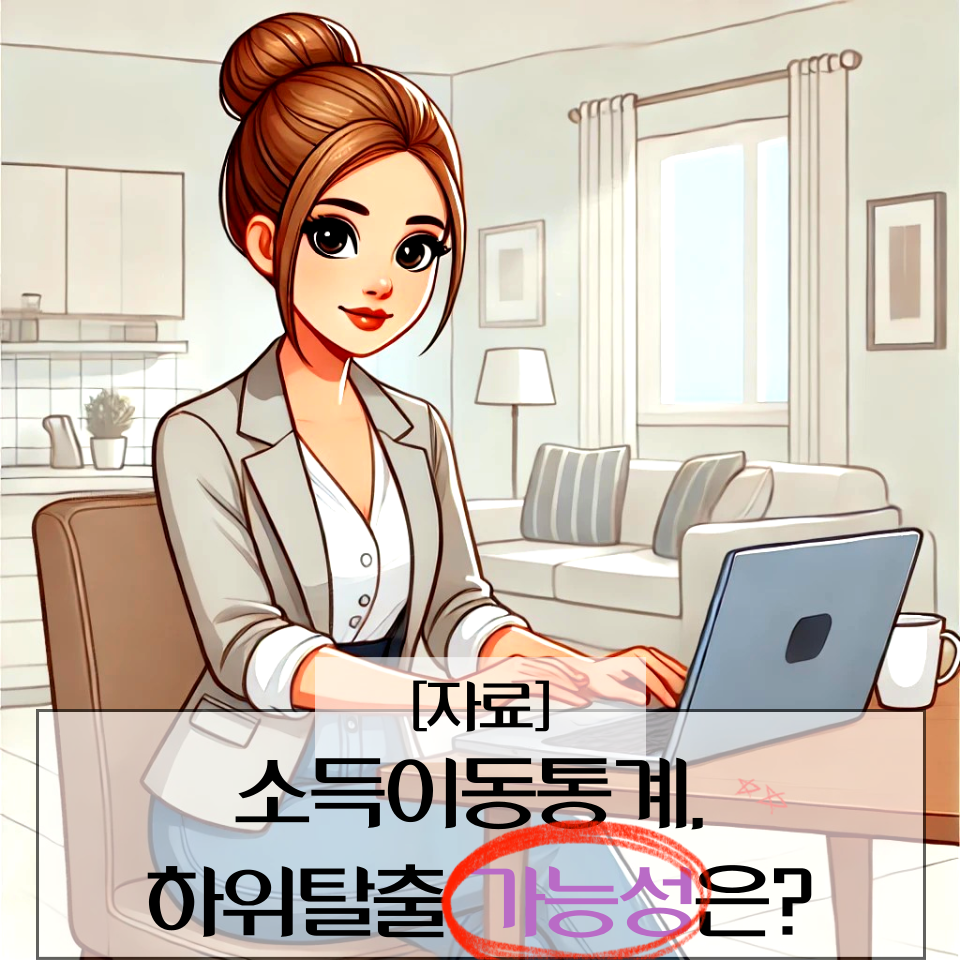
아래에서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.
소득이동성: 현실과 의미
소득이동성 통계란 무엇일까?
소득이동성 통계는 개인이나 계층이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또는 하위 계층으로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분석하는 데이터입니다. 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국세청 소득자료와 등록센서스를 결합해 약 1,100만명의 방대한 표본을 패널 형태로 구축했습니다.
2017~2022 소득이동통계 주요 결과
- 소득분위 이동률: 전체의 34.9%가 소득분위 상승 또는 하락을 경험했습니다.
- 상향 이동: 17.6% (소득 증가), 하향 이동: 17.4% (소득 감소)
- 청년층(15~39세)의 소득이동성(41%)이 노년층(25.7%)보다 두드러지게 높았습니다.
하위층 탈출률과 지속성
소득 1분위에 속했던 사람 중 68.7%가 2022년까지 상위 계층으로 이동했습니다. 그러나 나머지 31.3%는 여전히 하위 계층에 머물러 있어, 계층 고착화의 문제도 함께 드러났습니다.
청년층 vs 노년층: 소득이동성의 차이점
- 청년층: 소득이동성이 높아 23%가 상향 이동했습니다. 이는 취업, 창업 등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.
- 노년층: 소득 하향 비율이 높고 이동성이 낮아, 39.8%가 여전히 하위 1분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. 이는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.

소득이동성 둔화의 원인과 전망
1. 코로나19 이후 경제 충격: 2020년 소득이동성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.
2. 노년층의 하향 이동: 고령화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이동성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.
3. 성별 차이: 여성의 소득 이동성은 남성보다 높지만, 여전히 하위 계층에서 더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.
해결책과 정책 방향
- 청년층 일자리 창출: 청년층의 경제활동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.
- 노년층 소득 안정화: 공적 연금 확대와 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년층의 소득 하향을 막아야 합니다.
- 사회 이동성 개선: 소득분위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복지 정책과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.

'살림&재테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우리집이 레버리지를 하는 이유(feat. 백테스트) (0) | 2025.01.11 |
|---|---|
| 레버리지 ETF로 수익 극대화! 미국 대표 상품 소개 (0) | 2025.01.04 |
| 토스 주식모으기 소수점 투자 후기: 소액으로 테슬라, 리얼티인컴과 TQQQ에 투자중 (6) | 2024.12.16 |
| 소비자 물가지수(CPI)란? 쉽게 이해하는 경제 지표 (1) | 2024.12.12 |
|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의와 주식시장: 과거 사례와 투자 전략 (2) | 2024.12.09 |